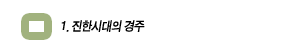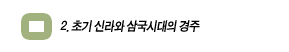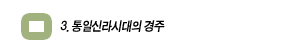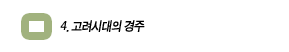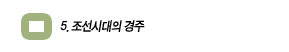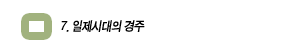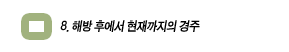옛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정치·교육·사상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 중 신라는 가장 후진성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민족통일을 이룩하고 7세기 이후에는 한반도의 원산만 이남 일대를 지배하게 된다. 통일신라의 핵심적 위치였던 경주는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으며, 8세기~9세기는 신라문화의 찬란한 전성기였다.
신라의 화랑정신은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 후에도 한국인들의 정신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위대한 신라문화의 유산은 신라의 옛 터인 경주를 중심으로 폭넓게 산재해 있으며, 특히 유네스코가 세계 10대 유적 도시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그 유물의 종류와 가치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신라인들은 우리의 사상과 종교·학문의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하였는데, 해동불교의 조종(祖宗)이라 불리는 원효(元曉), 의상(義湘)대사와 이두(吏讀)를 집대성한 설총(薛聰), 그리고 최치원, 김유신 등은 신라에서 배출된 인재들이다.
고려시대에는 비록 수도를 개경으로 옮기기는 했으나 경주는 여전히 전 왕조의 서울로 존중받았으며, 신라인들은 고려조의 다방면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려의 중앙 집권체제를 확립한 최승로은 경주출신으로 경순왕을 따라 고려에 갔으며,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 신라 왕실의 후손이다.
조선 시대에는 성리학의 대가인 회재(晦齋) 이언적을 배출하였는데, 그는 교육기관을 세워서 유학교육에 전념하였다.
근대에는 우리 고유의 종교인 동학(東學)이 창시되었는데 그 창시자인 최제우(崔濟愚)도 경주인이다. 동학의 사상은 동학농민운동의 원동력이 되었고, 3·1운동의 근원적 추진력이 되었으며,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듯이 신라의 수도 경주 지역은 한민족과 한문화와 한국사가 형성한 거의 모든 분야의 뿌리이며, 문화 사상들이 살아 숨 쉬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주 지역은 우리 민족의 역사 발전사에 있어서 ‘인재의 곳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 등 전반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던 것이다.
오늘날 경주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유물은 민족의 정신이 살아 있는 교육장으로 후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1. 고려초기 경주의 행정체제
경순왕 김부가 태조의 부마가 되고 경주의 식읍과 막대한 세록을 받고 태자 지위의 위에 가는 관직을 받을 당시 신라의 문물과 인재가 모두 고려에 가게 되었다. 경주 역사상 전무후무한 획기적인 대사건이었다. 이때 고도로 발달한 신라의 문물제도는 고려에 의하여 계승되는데, 언어도 신라어가 고려의 언어로 계승되었다. 많은 신라의 인재가 고려에 가서 중앙의 핵심인물이 되었는데, 개국 일등 공신에 백옥삼(白玉衫), 배현경(裴玄慶), 국초 문병(文炳)을 관장한 최언위, 최승로 등과 불교계의 고승으로 광자대사(廣慈大師) 윤다(允多), 진공대사(眞空大師), 광학대덕(廣學大德), 능경(能競) 등은 태조의 불교 정책 뿐 아니라 일통삼국에 공헌한 고승들로 태조의 존경을 받았다.
고려 태조는 경순왕이 나라를 내놓고 투항하자 국호인 신라를 없애고 경주라 개칭했다가 동23년에 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라 고치고 읍호(邑號)를 경주사(慶州司) 도독부(都督府)라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안남도부서사(安南都府署使) 본영을 삼았다.
성종 6년(995)에는 안동대도호부(경주대도독부)를 동경유수관으로 개정하고 동왕 14년에는 유수사(留守使)라 부르게 되었으며 영동도(嶺東道)를 관할하게 되었다.
현종 3년(1012)에는 동경유수관제가 혁파되었다. 경주방어사(慶州防禦使)로 개칭되었으니, 관등이 강등되었던 것이다. 다시 현종 5년(1014)에는 안동대도호부로 개칭되고, 현종 9년(1018)에는 경주대도호부(慶州大都護府)로 개칭되었다.
현종 18년에는 광평성의 첩(貼)으로써 12목(牧)을 개편하여 경주목으로 개편되었다. 현종 21년에는 다시 동경유수관으로 환원 개편했다. 그 이유를 『고려사』 57 「지리지」 제 11 지리 2 동경유수관 조에 그때 예방(銳方)이 올린 『삼한회토기(三韓會土記)』에 고려 삼경(三京)의 글이 있어 그 때문에 동경 유수관을 환원 복치했다.2. 무신 집정기의 경주
무신 집정기에는 무신의 착취와 탄압에 신음하던 피지배 계급 농민, 노비 등이 무신 정권에 항거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그 중 동경에서도 민란이 줄기차게 일어났는데 신라 부흥을 표방했다는 점이 여타 지역의 민란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동경의 민란은 총 8차에 걸쳐 일어났으며 신종(神宗) 7년에는 상주, 청주, 충주, 원주 등지까지 격문을 돌려 동조하기를 선동하여 자못 그 기세가 커져갔다. 이에 반란한 동경유수관을 지경주사(知慶州事)로 격하시키고 관내의 주(州), 부(府), 군(郡), 현(縣), 향(鄕), 부곡(部曲) 등의 관할을 상주, 안동 등에 뺏어 부속시켰다. 그러다가 고종 6년(1219)에 동경유수관으로 회복시켰다.
고종 25년 윤 4월에는 몽고군이 동경으로까지 침입하여 그 유명한 대가람 황룡사를 불태웠다. 이때 황룡사의 금당과 그 안에 봉안했던 장육삼존불상(丈六三尊佛像)과 9층 목탑과 49만근에 이르는 대종 등 한국 제1의 국보 사찰 황룡사와 국보급 문화재가 잿더미로 화해버렸다. 뿐만 아니라 경주의 많은 문화재가 이때 약탈 또는 소실되었다.3. 고려 후기 경주의 행정체제
경주는 충렬왕 34년(1308)에 계림부(鷄林府)로 개편 되었다. 그 후 고려가 망할 때까지 계림부로 존속되었다.
신라시대의 경주(서라벌)는 수도였기 때문에 육부 외에는 별도의 관할이 있을 수 없었지만 고려시대는 경주 또한 하나의 지방 도시였으므로 당연히 일정한 영역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상고해 보지 않고는 당시 경주의 규모나 위상을 파악할 수가 없다 하겠다. 동경유수관의 관할은 영동도의 9주 35현이었다. 9주는 김주(金州:김해), 영주(永州:영천), 하주(河州:하양), 함주(咸州:함안), 밀주(密州:밀양), 예주(禮州:흥해), 울주(蔚州:울산), 양주(梁州:양산) 등을 말한다.
참고 문헌
국역 경주읍지, 조철제 옮김, 경주시.경주문화원, 2003
경주시사(慶州市史) Ⅰ, 경주시사편찬위원회, 2006